크래프톤 정글 2DAY 특별한 에세이
코딩에서 예술까지
누군가에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연출이든 문예창작이든 근본적으로 뜯어보면 코드리뷰 비슷한 합평 수업도 있고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관성적인 면이 강하다는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예술가와 개발자는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다.
미리 나에 대해 스포일러를 하자면, 나에게 코딩은 예술보다 더 도전적이며 모험적인 과정이자 취미였다.
그래서 그 취미와 행복이 과연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해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다.
재능충에서 노력충으로 강등
물론 나는 이 단어를 싫어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나는 내 분야에서는 재능충에 속하는 편이다.
애초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집안 식구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배구 선수출신이신 엄마만 봐도 그렇고 나도 뭐 그냥 헬스장 한 반년 다니면 본인 몸무게의 1.5배 남자 기준 2배는 다들 드는 줄 알았으니까 말이다.
그 외에도 어린시절 가수를 하겠답시고 오디션에 다짜고짜 간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유명한 곳에서 그래도 꽤 높은 차수의 최종심까지는 들었었다.
그러나, 나에겐 딱 하나 안좋은 버릇이 있었는데 바로 지나치게 내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의 그런 성향은 도망치긴 죽어도 싫으니 견디기나 하자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2-3학년 때 김혜순 교수님과 채호기 교수님께서 나의 재능에 대해 한마디를 하셨던 것이 내가 코딩을 업으로 삼은 가장 큰 이유였다.
감각도 있고 재능도 있는 친구고 내가 보았을 때에는 본인이 노력을 싫어하는 타입도 아닌데 도대체 왜 학교를 잘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 때 교수님이 나에게 혼을 많이 냈다면, 그리고 나의 평생 행복에 대해 빌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코딩을 업으로 삼고 싶다고 결심하지는 못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나름 재능충이었던 생활을 접고 다시 맨몸으로 돌아온 원시인이다.
당시에는 내가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교수님들이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게 느껴져서 행복해지고 싶었다.
이 업계 꽤나 공정하다
나는 코치님들의 강의와 연설을 들으면서 개발 업계는 재능이 없어도 노력과 일종의 관성으로 고액 연봉자까지는 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스포츠 선수 생활은 암만 능력이 뛰어나도 내구성 하나가 부족하여 일찍이 선수생활을 접는 사람도 꽤 많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도 예체능 실기 과외를 많이 해보았으나, 안타깝게도 예체능은 정말 재능이 없다면 보통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하고싶은 공부를 해봤으니 미련 없는 일 일 수 있으나, 상당히 잔인한 업계인 것이다.
무엇이 되고 싶을까
나는 입시과외를 할 때 학생들에게 첫 수업에서 허무맹랑한 공상이라는 것과 예술이 될 수 있는 공상 혹은 상상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꼭 질문을 한다.
사실 내 질문엔 명확한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명확한 오답은 존재한다.
나는 근원적인 고민들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끝장을 보아야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정글에 들어오게 되었다.
비전공자여도 cs가 탄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긴 했으나 지식이 지나치게 산발적이어서 내 스스로는 내가 백지처럼 여겨졌다.
분명 둘레길 정도는 돌아본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나무가 있고 흙이 있었어요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기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싶었고, 컴퓨터가 왜 지금처럼 발달하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서로를 보완해주는가와 같은 부분들이 궁금했던 것 같다.
자세
사실 처음 들어올 때에는 cs에 대한 넓은 시야와 풀스택 개발자가 되고싶음만 생각했는데 0주차 프로젝트를 하고나니 협업과 나의 성격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것 같다.
군인이었던 삼촌이 가끔 술 먹으면 했던 농담 중 하나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1-2만명 즈음은 금방 골로 간다는 거였는데, 나도 늘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힘이 팍 들어간 태도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삼촌의 말이 너무 슬펐다.
0주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사람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나와 같이 무겁고 각잡고 딱 정답을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누가 틀리고 맞은 것은 아니었으나, 0주차 프로젝트는 나에게 무겁게 표현해보자면 죄책감같은 측면이 강하다.
나는 세계를 클릭한다
내가 좋아하는 시 속에서 나오는 구절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나는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싶다.
이유는 없다, 나는 모든 것들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대하는 편인데(이번에도 내 생각이 틀릴까봐 이야기를 안하는 바람에 우리팀 백엔드 한명이 두시간을 혼자 날려버렸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정말 초침만 흘러가는 꼴이다.
그래서 이번 정글 에세이는 일부로 진솔하고 적당히 지르는 호흡으로 써봤는데
오히려 나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들켜버린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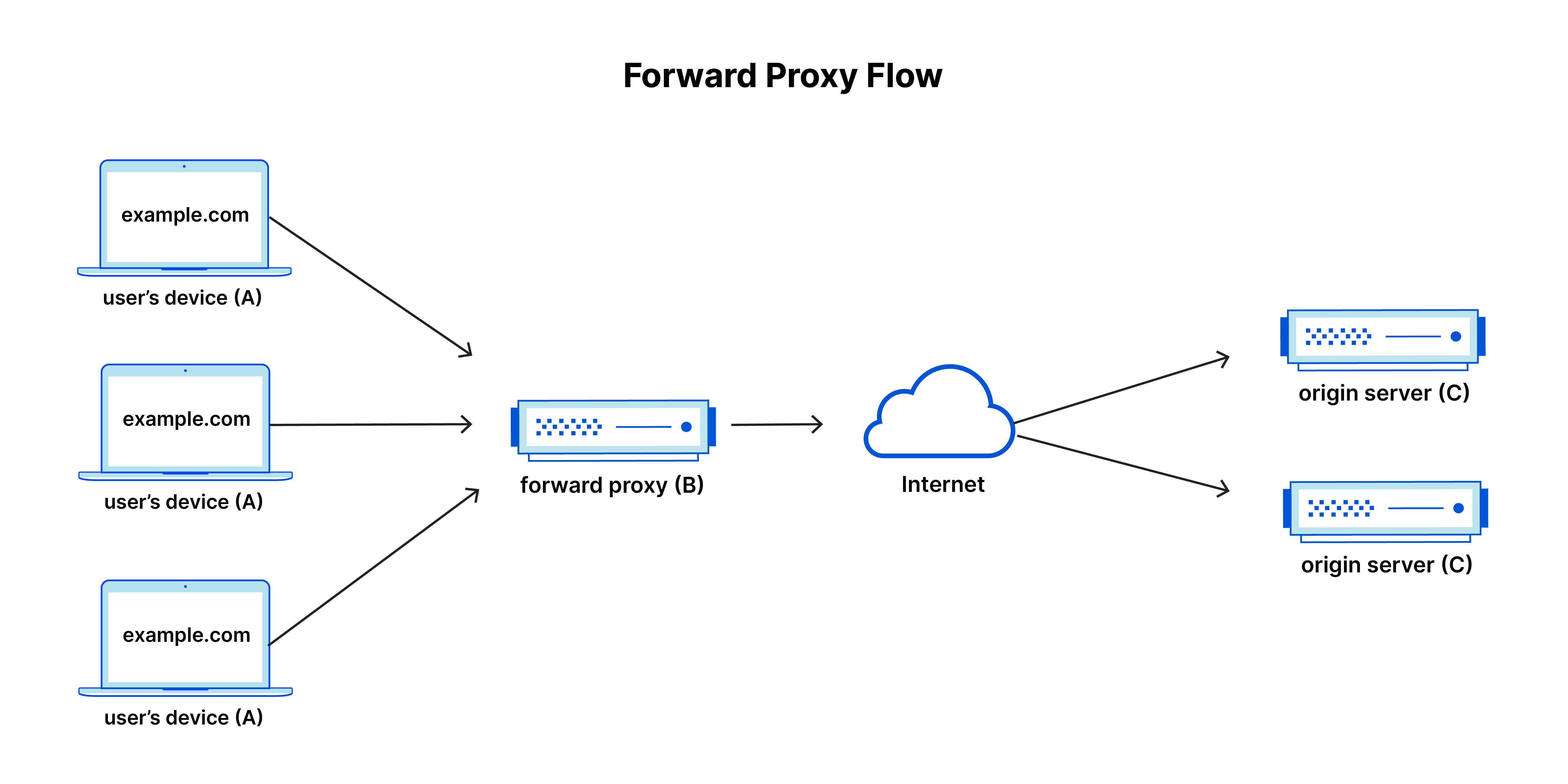
댓글남기기